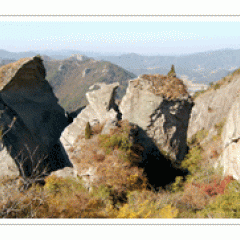소설은 역사가 되어 벌교 들판을 적시고
소설은 역사가 되어 벌교 들판을 적시고
by 운영자 2006.01.13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이 있다.
내게 ‘벌교’는 그런 곳이다.
소설 의 기운이 살아숨쉬는 곳, 한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수없이 짓밟히고 다시 일어났던 곳,
벌교.
1980년대 후반 작가 조정래가 발표한 대하소설 은 당시만 해도 금기시됐던 ‘빨치산’과 ‘남로당’의 실체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이 소설은 일제 말기∼해방∼여순사건∼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격랑을 대서사시처럼 엮어낸다. 역사의 베틀은 남해안의 한 포구인 벌교에서부터 조계산, 지리산, 태백산, 거제포로수용소 등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한올 한올 짜여진다.
그 중심인 지리산의 골짜기와 능선들은 단순히 지형지물만이 아니다. 그 자체가 역사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이 이데올로기란 이름으로 버무려져 있는 공간이다.
역사의 한을 기억하고 있는 곳, 벌교
우리나라 어느 한구석 서리서리 역사의 아픔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특히나 보성 벌교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벌교는 다리로 이어진 땅이다.
벌교천이 읍의 정중앙을 갈라놓아 나눠진 두 땅이 교류하는 길은 다리밖에 없었다.
그저 끊어진 길을 연결하기 위해 놓았을 뿐인 다리들은 벌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다리들은 반세기가 넘게 지나버린 피비린내의 시간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가 벌교를 장악했을 때 수많은 우익인사들이 다리 위에서 죽어 나갔고 반대로 14연대가 토벌군에 쫓겨 입산한 다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좌익들 쪽으로 미쳤다.
이분법으로만 분화된 이념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이 벌교천 다리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목숨을 잃었다.
■ 용머리 빼면 무너지는 횡갯다리, 홍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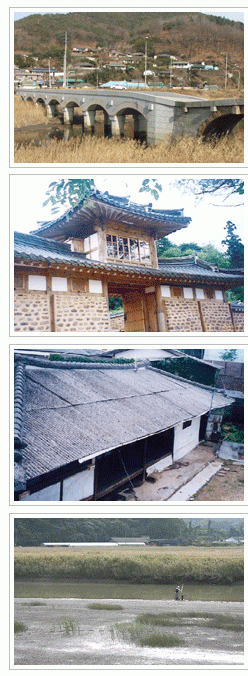
횡갯다리의 정식 명칭은 홍교다.
그러나 벌교사람들은 ‘횡갯다리’라고 부른다. 홍교와 다리가 합쳐져 사투리로 변한 이름이다.
한때 소화다리와 핏물로 이어졌던 횡갯다리는 보수공사를 거치면서 어색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현재 횡갯다리에는 두 개의 다리가 함께 붙어 있다.
횡갯다리는 선암사의 시주에 의해 1734년에 만들어졌다.
선암사의 승선교를 모방해 용머리까지도 똑같은 모양이다.
용머리는 다리 해체를 위해 쓰인다.
평상시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치형의 다리가 용머리를 빼내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벌교에서 횡갯다리는 그 자체로 역사다.
만들어진 세월이 그렇고 그것의 쓰임 또한 나눠진 벌교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작가 조정래가 에서 좌익인 염상진, 하대치 등 빨치산들이 소작인들에게 설을 쇨 쌀을 쌓아뒀던 곳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이곳은 현존하는 아치형 다리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보물 제304호로 지정되었으며 사실상 벌교의 상징이다.
■ 대갓집의 풍모 당당한, 현부자집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현부자집.
정하섭이 숨어 지내던 곳인 이곳은 아직도 이층솟을 대문이 장관이다.
1930년대 목욕탕 한 개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목욕을 하던 시절에 이미 목욕탕을 갖춘 으리으리한 집.
지금은 사람 기척이 없어진 지 8년이 넘어 폐허가 되었지만 아직도 위풍당당한 기세를 느낄 수 있다.
기와와 처마는 한옥의 틀을 갖췄으나 나머지는 일본식 건물이다.
대문 앞에 있는 연못은 조금 넓혀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연못 가운데 동산은 당시 그대로다.
현부자집 입구 왼편으로는 공사 현장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이념갈등으로 몇 년째 보류되었던 일이 차츰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 드넓은 곳에 서린 한, 중도방죽
현부자네 높은 마당에 서면 멀리 중도들판이 내려다보인다.
길게 펼쳐져 있는 중도들판은 벌교 앞바다 10여리를 둑으로 막아 일군 눈물어린 간척농지다.
일본인 중도(中島 나카시마)의 이름을 따 붙인 중도방죽은 사람의 손으로 돌과 흙을 퍼날라 땅을 만들었지만 일제와 해방 후 지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소작인의 한이 서려있는 곳이다.
소설 속에서 방죽 쌓던 때의 어렵고 골빠지게 힘들었던 일을 하대치의 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금은 그 덕에 벌교의 3대평야에 들어간단다.
■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소화다리’
벌교는 해방 이후 주변 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다.
일제시대부터 이미 역이 건설됐고, 밀물과 썰물이 들고나는 벌교천 항구에서 배를 띄우면 반나절에 여수까지 닿을 수 있는 이점으로 전남 동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른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소화다리다. 지금은 사람의 통행만 가능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소화다리. 한때 그곳은 살육의 공간이었다.
소화다리가 학살의 현장으로 악용된 것은 난간 때문이다.
소화 6년(1931년)에 다리가 처음 놓아질 때만 해도 쇠 난간이 길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대동아전쟁에서 연합군에 밀리며 대규모로 쇠를 공출해 간다.
소화다리 난간도 그때 뜯겨 나갔다. 문제는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 그 난간이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난간이 없는 탓에 소화다리는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뒤집어쓰게 된다.
난간 없는 다리에 처형할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 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시체가 그대로 벌교천으로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체 처리가 손쉬운 데다 학살의 당사자는 죄의식조차 느낄 필요가 없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
취재 : 최명희 기자
그러나 벌교사람들은 ‘횡갯다리’라고 부른다. 홍교와 다리가 합쳐져 사투리로 변한 이름이다.
한때 소화다리와 핏물로 이어졌던 횡갯다리는 보수공사를 거치면서 어색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현재 횡갯다리에는 두 개의 다리가 함께 붙어 있다.
횡갯다리는 선암사의 시주에 의해 1734년에 만들어졌다.
선암사의 승선교를 모방해 용머리까지도 똑같은 모양이다.
용머리는 다리 해체를 위해 쓰인다.
평상시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치형의 다리가 용머리를 빼내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벌교에서 횡갯다리는 그 자체로 역사다.
만들어진 세월이 그렇고 그것의 쓰임 또한 나눠진 벌교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작가 조정래가 에서 좌익인 염상진, 하대치 등 빨치산들이 소작인들에게 설을 쇨 쌀을 쌓아뒀던 곳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이곳은 현존하는 아치형 다리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보물 제304호로 지정되었으며 사실상 벌교의 상징이다.
■ 대갓집의 풍모 당당한, 현부자집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현부자집.
정하섭이 숨어 지내던 곳인 이곳은 아직도 이층솟을 대문이 장관이다.
1930년대 목욕탕 한 개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목욕을 하던 시절에 이미 목욕탕을 갖춘 으리으리한 집.
지금은 사람 기척이 없어진 지 8년이 넘어 폐허가 되었지만 아직도 위풍당당한 기세를 느낄 수 있다.
기와와 처마는 한옥의 틀을 갖췄으나 나머지는 일본식 건물이다.
대문 앞에 있는 연못은 조금 넓혀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연못 가운데 동산은 당시 그대로다.
현부자집 입구 왼편으로는 공사 현장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이념갈등으로 몇 년째 보류되었던 일이 차츰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 드넓은 곳에 서린 한, 중도방죽
현부자네 높은 마당에 서면 멀리 중도들판이 내려다보인다.
길게 펼쳐져 있는 중도들판은 벌교 앞바다 10여리를 둑으로 막아 일군 눈물어린 간척농지다.
일본인 중도(中島 나카시마)의 이름을 따 붙인 중도방죽은 사람의 손으로 돌과 흙을 퍼날라 땅을 만들었지만 일제와 해방 후 지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소작인의 한이 서려있는 곳이다.
소설 속에서 방죽 쌓던 때의 어렵고 골빠지게 힘들었던 일을 하대치의 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금은 그 덕에 벌교의 3대평야에 들어간단다.
■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소화다리’
벌교는 해방 이후 주변 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다.
일제시대부터 이미 역이 건설됐고, 밀물과 썰물이 들고나는 벌교천 항구에서 배를 띄우면 반나절에 여수까지 닿을 수 있는 이점으로 전남 동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른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소화다리다. 지금은 사람의 통행만 가능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소화다리. 한때 그곳은 살육의 공간이었다.
소화다리가 학살의 현장으로 악용된 것은 난간 때문이다.
소화 6년(1931년)에 다리가 처음 놓아질 때만 해도 쇠 난간이 길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대동아전쟁에서 연합군에 밀리며 대규모로 쇠를 공출해 간다.
소화다리 난간도 그때 뜯겨 나갔다. 문제는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 그 난간이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난간이 없는 탓에 소화다리는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뒤집어쓰게 된다.
난간 없는 다리에 처형할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 놓고 방아쇠를 당기면 시체가 그대로 벌교천으로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체 처리가 손쉬운 데다 학살의 당사자는 죄의식조차 느낄 필요가 없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
취재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