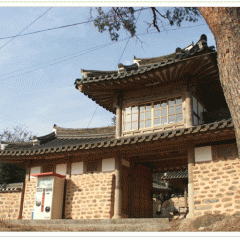도란도란 호젓하게 오르는 오밀조밀 등산길 [보성 오봉산]
도란도란 호젓하게 오르는 오밀조밀 등산길 [보성 오봉산]
by 운영자 2006.01.13

초보 등산객은 운동 부족 탓인지 등산을 하면 늘 힘이 부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에 올라 “야호!” 소리치고 싶은 것은 마음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초보 등산객에게 딱 좋은 산, 보성 오봉산. 392m의 오봉산은 높거나 험난하지 않아 보성의 너른 들과 너른 바다를 보며 마음껏 “야호!” 소리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게다가 용추계곡, 칼바위 등 볼거리도 많다.
순천에서 보성 방면 2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845번 지방도를 타고 득량 방향으로 진행, 해평리 기남마을에 닿는다. 등산로는 칼바위 쪽으로 오르거나 용추폭포 쪽으로 오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좁다란 오솔길 산행을 하고 싶다면 칼바위로 곧장 오르기보다 용추폭포 쪽으로 시작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등산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맞닥뜨리는 것은 용추폭포. “에게, 이게 뭐야?”란 말이 절로 나온다.
겨울 가뭄 때문에 ‘콸콸’ 물을 토해내는 폭포가 아니라 ‘잴잴~’ 오줌을 싸고 있는 수도꼭지 같다.
‘용이 나왔다 해서 용龍자가 붙은 용추폭포’ ‘밑의 용소는 옛날에는 그 소로 명주실꾸리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었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
사람 하나 겨우 꿰고 지나갈 만한 좁다랗고 호젓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가다 이제 좀 숨이 차다 싶을 즈음에 정상 392m봉에 닿는다.
다른 산처럼 정상이라고 생색내는 표석도 없지만 눈앞이 번쩍 뜨이는 시원한 풍경은 이곳이 정상임을 말 없이도 알려 준다. 득량만과 고흥반도가 한눈에 펼쳐진다. 너른 벌과 바다가 가슴 안에 들어온다. 그래, 이 맛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지 싶다.
이곳에서 쭉 능선을 타면 칼바위에 이른다.
오봉산의 으뜸인 칼바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기묘묘하다. 우람하다. 날큼한 칼 끝 같기도 하고, 버선코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칼바위 때문에 오봉산을 ‘칼봉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칼바위는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수도 터로 삼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는 곳이다.
칼바위 부근에는 여러 바위 봉우리들과 굴이 있다.
칼바위 아래 있는 굴은 사방을 높은 바위벽이 둘러싼 공간으로 50여 명이 들어설 수 있는 큰 규모다.
임진왜란 때 인근 사람들이 이곳에 피난와 화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칼바위 등 바위봉우리 아래는 납작한 돌로 이루어진 너덜지대가 많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틈이 없이 촘촘한 이곳에서 한때는 구들장을 떴다 한다.
오봉산 구들돌은 널찍하고 반듯하고 단단해서 이름이 높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닌 오봉산은 가족 산행지로 그만이다.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다 보면 너른 벌과 너른 바다를 가슴에 가득 담아올 수 있을 것이다.
글 : 최명희 기자
정상에 올라 “야호!” 소리치고 싶은 것은 마음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초보 등산객에게 딱 좋은 산, 보성 오봉산. 392m의 오봉산은 높거나 험난하지 않아 보성의 너른 들과 너른 바다를 보며 마음껏 “야호!” 소리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게다가 용추계곡, 칼바위 등 볼거리도 많다.
순천에서 보성 방면 2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845번 지방도를 타고 득량 방향으로 진행, 해평리 기남마을에 닿는다. 등산로는 칼바위 쪽으로 오르거나 용추폭포 쪽으로 오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좁다란 오솔길 산행을 하고 싶다면 칼바위로 곧장 오르기보다 용추폭포 쪽으로 시작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등산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맞닥뜨리는 것은 용추폭포. “에게, 이게 뭐야?”란 말이 절로 나온다.
겨울 가뭄 때문에 ‘콸콸’ 물을 토해내는 폭포가 아니라 ‘잴잴~’ 오줌을 싸고 있는 수도꼭지 같다.
‘용이 나왔다 해서 용龍자가 붙은 용추폭포’ ‘밑의 용소는 옛날에는 그 소로 명주실꾸리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었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
사람 하나 겨우 꿰고 지나갈 만한 좁다랗고 호젓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가다 이제 좀 숨이 차다 싶을 즈음에 정상 392m봉에 닿는다.
다른 산처럼 정상이라고 생색내는 표석도 없지만 눈앞이 번쩍 뜨이는 시원한 풍경은 이곳이 정상임을 말 없이도 알려 준다. 득량만과 고흥반도가 한눈에 펼쳐진다. 너른 벌과 바다가 가슴 안에 들어온다. 그래, 이 맛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지 싶다.
이곳에서 쭉 능선을 타면 칼바위에 이른다.
오봉산의 으뜸인 칼바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기묘묘하다. 우람하다. 날큼한 칼 끝 같기도 하고, 버선코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 칼바위 때문에 오봉산을 ‘칼봉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칼바위는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수도 터로 삼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는 곳이다.
칼바위 부근에는 여러 바위 봉우리들과 굴이 있다.
칼바위 아래 있는 굴은 사방을 높은 바위벽이 둘러싼 공간으로 50여 명이 들어설 수 있는 큰 규모다.
임진왜란 때 인근 사람들이 이곳에 피난와 화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칼바위 등 바위봉우리 아래는 납작한 돌로 이루어진 너덜지대가 많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틈이 없이 촘촘한 이곳에서 한때는 구들장을 떴다 한다.
오봉산 구들돌은 널찍하고 반듯하고 단단해서 이름이 높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닌 오봉산은 가족 산행지로 그만이다.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다 보면 너른 벌과 너른 바다를 가슴에 가득 담아올 수 있을 것이다.
글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