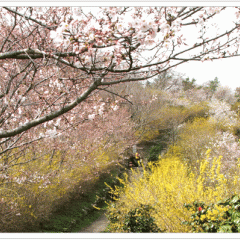꽃과 바다 사람이 함께 풍경인 곳, 남해
꽃과 바다 사람이 함께 풍경인 곳, 남해
by 운영자 2006.04.21

오른편으로 햇빛에 반짝이는 남해 바다와 왼편으로 초록의 숲.
그 사이 구불구불 재미나게 난 도로 위로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마치 영화 의 ‘팝콘’ 장면 같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앞 차가 내는 속력만큼의 파장으로 내리는 눈꽃. 기막힌 광경이다. 하늘과 땅에서 눈꽃이 흩뿌려진다.
연약한 흰 꽃잎은 공기를 따라 어지러이 부유하고 줄곧 사람의 눈과 마음을 홀린다.
긴 겨울, 추위와 차가운 눈보라를 이겨낸 벚꽃나무는 반가운 4월의 햇빛 아래서 ‘톡톡’ 꽃망울을 터뜨리며 고운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낙화의 과정을 지내며 살며시 초록의 잎을 돋아내고 있다.
4월의 남해는 벚꽃이 절경이다.
하지만 벚꽃만이 다가 아니다.
벚꽃이 지고 난 나무에는 초록의 잎이 고개를 내밀고 푸른 마늘밭 사이사이 노란 유채꽃이, 바닷길 가운데 가운데 물 오른 튤립이 탐스럽다.
마늘밭의 초록과 병아리 노란 유채꽃, 튤립의 길쭉한 초록잎과 붉은 꽃잎, 샛노란 수술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다. 정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다. 벚꽃의 은은한 이미지와 너무도 대조적인 이미지. 4월의 남해는 벚꽃만이 아니다.
꽃 따라 물결 따라 봄이 출렁이는, 남해
남해는 참 지척이다.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에 닿을 수 있는 길. 가는 길 내내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눈이 행복한 곳, 남해로 향한다. 봄 하늘답게 하늘이 참 파랗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잠시 짬을 내서 들른 섬진강 휴게소. 민물과 바닷물의 만남은 언제나 싱그럽다. 하동 IC를 빠져 남해 방향으로 10km쯤 달리자 남해대교가 나온다.
노량해협을 가로지는 다리. 어렸을 적 ‘동양 최대의 현수교’라는 대대적인 광고에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싶어 했던 곳. 엄마, 아빠, 동네 어르신들의 관광버스 여행에서 빠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남해대교다.
엄마 아빠는 남해대교를 다녀오실 때마다 남해대교가 멋지게 인쇄된 책받침을 선물로 사다주셨다. 어린 시절 남해대교를 책받침으로 만나며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던 다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
30년의 세월 동안 다리는 그대로였지만 보는 내 눈은 커져서 “에게? 뭐야? 작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하지만 다리 양 옆으로 잔잔히 흐르는 바다는 꽃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기분 좋게 출렁인다.
눈부신 쪽빛 바다 사이로 여기저기 솟은 푸른 섬과 곳곳에 가득 뜬 하얀 부표가 마치 바다에 피어난 하얀 벚꽃처럼 느껴진다. 상쾌한 아침 바람은 봄기운을 가득 품고 남해 바다의 신비로움을 한층 더해준다.
흐드러지게 피어 4월 봄에도 근사한 눈꽃을 선사하던 벚꽃나무는 꽃잎이 거의 지고 난 뒤다. 벚꽃 눈구름이 뭉실뭉실 산을 뒤덮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벚꽃나무는 어느새 초록 잎을 키워내고, 산은 연초록 물결이 인다.
남해읍으로 향하는 길섶에는 반짝이는 초록 마늘밭이 가득하다.
마늘밭 귀퉁이마다 노란 유채꽃을 심어두었는데 초록 마늘밭과 노란 유채꽃이 참 잘 어울린다. 튀지 않게 예쁜, 은은한 멋이 있는 옛 가구 같다.
일반적으로 남해 여행 코스는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고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간지러운 봄 냄새가 섞인 바다 내음을 맡고 싶어, 하늘빛 닮은 바다가 보고 싶어 해안으로 해안으로만 달려보기로 한다.
그 사이 구불구불 재미나게 난 도로 위로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마치 영화 의 ‘팝콘’ 장면 같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앞 차가 내는 속력만큼의 파장으로 내리는 눈꽃. 기막힌 광경이다. 하늘과 땅에서 눈꽃이 흩뿌려진다.
연약한 흰 꽃잎은 공기를 따라 어지러이 부유하고 줄곧 사람의 눈과 마음을 홀린다.
긴 겨울, 추위와 차가운 눈보라를 이겨낸 벚꽃나무는 반가운 4월의 햇빛 아래서 ‘톡톡’ 꽃망울을 터뜨리며 고운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낙화의 과정을 지내며 살며시 초록의 잎을 돋아내고 있다.
4월의 남해는 벚꽃이 절경이다.
하지만 벚꽃만이 다가 아니다.
벚꽃이 지고 난 나무에는 초록의 잎이 고개를 내밀고 푸른 마늘밭 사이사이 노란 유채꽃이, 바닷길 가운데 가운데 물 오른 튤립이 탐스럽다.
마늘밭의 초록과 병아리 노란 유채꽃, 튤립의 길쭉한 초록잎과 붉은 꽃잎, 샛노란 수술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다. 정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다. 벚꽃의 은은한 이미지와 너무도 대조적인 이미지. 4월의 남해는 벚꽃만이 아니다.
꽃 따라 물결 따라 봄이 출렁이는, 남해
남해는 참 지척이다.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에 닿을 수 있는 길. 가는 길 내내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눈이 행복한 곳, 남해로 향한다. 봄 하늘답게 하늘이 참 파랗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잠시 짬을 내서 들른 섬진강 휴게소. 민물과 바닷물의 만남은 언제나 싱그럽다. 하동 IC를 빠져 남해 방향으로 10km쯤 달리자 남해대교가 나온다.
노량해협을 가로지는 다리. 어렸을 적 ‘동양 최대의 현수교’라는 대대적인 광고에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싶어 했던 곳. 엄마, 아빠, 동네 어르신들의 관광버스 여행에서 빠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남해대교다.
엄마 아빠는 남해대교를 다녀오실 때마다 남해대교가 멋지게 인쇄된 책받침을 선물로 사다주셨다. 어린 시절 남해대교를 책받침으로 만나며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던 다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
30년의 세월 동안 다리는 그대로였지만 보는 내 눈은 커져서 “에게? 뭐야? 작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하지만 다리 양 옆으로 잔잔히 흐르는 바다는 꽃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기분 좋게 출렁인다.
눈부신 쪽빛 바다 사이로 여기저기 솟은 푸른 섬과 곳곳에 가득 뜬 하얀 부표가 마치 바다에 피어난 하얀 벚꽃처럼 느껴진다. 상쾌한 아침 바람은 봄기운을 가득 품고 남해 바다의 신비로움을 한층 더해준다.
흐드러지게 피어 4월 봄에도 근사한 눈꽃을 선사하던 벚꽃나무는 꽃잎이 거의 지고 난 뒤다. 벚꽃 눈구름이 뭉실뭉실 산을 뒤덮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벚꽃나무는 어느새 초록 잎을 키워내고, 산은 연초록 물결이 인다.
남해읍으로 향하는 길섶에는 반짝이는 초록 마늘밭이 가득하다.
마늘밭 귀퉁이마다 노란 유채꽃을 심어두었는데 초록 마늘밭과 노란 유채꽃이 참 잘 어울린다. 튀지 않게 예쁜, 은은한 멋이 있는 옛 가구 같다.
일반적으로 남해 여행 코스는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고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간지러운 봄 냄새가 섞인 바다 내음을 맡고 싶어, 하늘빛 닮은 바다가 보고 싶어 해안으로 해안으로만 달려보기로 한다.

남해를 빨리 둘러보는 해안도로는 19번 도로다.
하지만 느긋하게 바다를 담아올 요량으로 19번 도로를 버리고 1024번 지방도로를 택했다.
고현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을 택해 접어든 고현면 갈화리, 중현리. 오른쪽에 바다를 낀다. 앞에 섬들이 많고 광양의 산업단지가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바다 맛은 그대로다. 갈매기가 날고, 잔잔한 파도가 일고, 배들이 떠다니는 바다 맛 그대로.
오후 햇살이 바다 표면에 부서져 눈이 부시다. 홍조를 머금은 빛. 그 볕 덕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차는 서면-덕월리-평산리를 이어 달리는데 점점 섬이 적어지고 바다는 넓어져가면서 바다 내음을 맡고픈, 바다를 보고픈 나의 바람을 풀어준다.
사촌해수욕장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가천 해안 관광도로로 접어든다. 바다는 더 넓게 열리고 늦은 햇살은 더 농염하게 바다를 어루만진다. 붉어진 빛은 시선두기가 버겁다. 다시 19번 도로를 만나 상주면 양아리 쪽으로 향한다. 5km쯤 더 가자 백련포구가 나온다.
할머니 품 속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의 겨드랑이 품 같기도 한 아늑한 포구다.
앞쪽으로 보이는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허지라는데, 한양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하룻밤에 썼다는 과 함께 아스라이 스친다.
너무도 유명한 상주해수욕장을 지나고 상록수림과 미조항, 망운산이 있는 미조리를 지나친다. 창선의 죽방렴이 보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남해와 창선도를 가로지르는 지족해협, 물살 세기로 둘째라면 서러울 물목에 참나무로 V자형 말뚝을 박고 대나무로 발을 엮어 그물을 세웠다.
일컬어 죽방렴(竹防簾)이다. 밀물을 따라 들어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통에 갇힌 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는 원시 어업이다. 물이 들고 나는 자연의 이치를 이용한 선조의 슬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고기잡이 방법이다.
“고기 종류는 싹 다 잡히는 기라. 그래도 멸치만큼 돈 되는 것도 없다 아이가.” 이른바 ‘죽방멸치’다.
그물에 걸린 멸치와 달리, 미끈한 대나무 통발에서 비늘조차 상하지 않은 ‘죽방멸치’는 상품 중 으뜸으로 친다.
물빛이 하늘빛으로 물드는 시간, 여울에 반짝이는 윤슬, 부챗살처럼 펼쳐진 죽방렴, 긴 파문을 일으키며 오가는 고깃배, 이 모두 한 폭의 그림이다.
창선을 지나 사천으로 향한다. 남해가 멀어진다. 크게 숨을 쉬어본다. 가슴속까지 남해바다가 들앉는다.
취재 : 최명희 기자
하지만 느긋하게 바다를 담아올 요량으로 19번 도로를 버리고 1024번 지방도로를 택했다.
고현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을 택해 접어든 고현면 갈화리, 중현리. 오른쪽에 바다를 낀다. 앞에 섬들이 많고 광양의 산업단지가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바다 맛은 그대로다. 갈매기가 날고, 잔잔한 파도가 일고, 배들이 떠다니는 바다 맛 그대로.
오후 햇살이 바다 표면에 부서져 눈이 부시다. 홍조를 머금은 빛. 그 볕 덕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차는 서면-덕월리-평산리를 이어 달리는데 점점 섬이 적어지고 바다는 넓어져가면서 바다 내음을 맡고픈, 바다를 보고픈 나의 바람을 풀어준다.
사촌해수욕장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가천 해안 관광도로로 접어든다. 바다는 더 넓게 열리고 늦은 햇살은 더 농염하게 바다를 어루만진다. 붉어진 빛은 시선두기가 버겁다. 다시 19번 도로를 만나 상주면 양아리 쪽으로 향한다. 5km쯤 더 가자 백련포구가 나온다.
할머니 품 속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의 겨드랑이 품 같기도 한 아늑한 포구다.
앞쪽으로 보이는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허지라는데, 한양에 계신 어머님을 위해 하룻밤에 썼다는 과 함께 아스라이 스친다.
너무도 유명한 상주해수욕장을 지나고 상록수림과 미조항, 망운산이 있는 미조리를 지나친다. 창선의 죽방렴이 보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남해와 창선도를 가로지르는 지족해협, 물살 세기로 둘째라면 서러울 물목에 참나무로 V자형 말뚝을 박고 대나무로 발을 엮어 그물을 세웠다.
일컬어 죽방렴(竹防簾)이다. 밀물을 따라 들어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통에 갇힌 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는 원시 어업이다. 물이 들고 나는 자연의 이치를 이용한 선조의 슬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고기잡이 방법이다.
“고기 종류는 싹 다 잡히는 기라. 그래도 멸치만큼 돈 되는 것도 없다 아이가.” 이른바 ‘죽방멸치’다.
그물에 걸린 멸치와 달리, 미끈한 대나무 통발에서 비늘조차 상하지 않은 ‘죽방멸치’는 상품 중 으뜸으로 친다.
물빛이 하늘빛으로 물드는 시간, 여울에 반짝이는 윤슬, 부챗살처럼 펼쳐진 죽방렴, 긴 파문을 일으키며 오가는 고깃배, 이 모두 한 폭의 그림이다.
창선을 지나 사천으로 향한다. 남해가 멀어진다. 크게 숨을 쉬어본다. 가슴속까지 남해바다가 들앉는다.
취재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