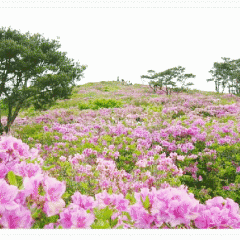꽃심을 지닌 땅, 소설 <혼불> 무대 남원 <혼불문학관>
꽃심을 지닌 땅, 소설 <혼불> 무대 남원 <혼불문학관>
by 운영자 2006.05.26

마침맞게, 어제는 비가 내려주었다.
가지런한 소리를 내며 내리는 비는 마음에 흘러들어 온 몸을 촉촉이 적신다. 그런 날이 있다.
눈부신 햇살 앞에 왈칵 하고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날. 오늘이 그랬다. 잘 보이는 안경을 낀 것처럼 눈앞이 맑게 보이는 비 갠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이런 날은 가만있을 수 없다.
어디든 가야 한다.
순천역에서 9시50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남원역으로 향한다. 혼불 마을에 가기 위해서다.
남원에 있는 혼불 마을로 가는 길, 사발 가득 흰쌀밥이 담긴 듯 사발꽃이 복스럽게 피었다. 자잘한 이팝나무도 꽃을 피워냈다. 막 모내기를 한 논에는 찰방찰방 물이 차 있다. 길섶의 민들레도 샛노란 빛을 뽐낸다.
눈물 나게 좋은 봄이다.
‘꽃심을 지닌 땅’과 ‘아소님하’라는 말을 새긴 장승이 세워져 있는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한겨울 없는 듯 죽은 듯 있던 온갖 꽃들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초록의 순을 올리고 피어난다.
절대 흩어지지 않을 ‘꽃의 힘’ ‘꽃심’이다.
한땀 한땀 수놓듯 싸목싸목 걸어가는 길
창 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기차 여행의 큰 즐거움이다.
남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남짓을 내내 창 밖만 바라보았다. 그래도 충분히 눈이 즐겁다.
가지런한 소리를 내며 내리는 비는 마음에 흘러들어 온 몸을 촉촉이 적신다. 그런 날이 있다.
눈부신 햇살 앞에 왈칵 하고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날. 오늘이 그랬다. 잘 보이는 안경을 낀 것처럼 눈앞이 맑게 보이는 비 갠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이런 날은 가만있을 수 없다.
어디든 가야 한다.
순천역에서 9시50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남원역으로 향한다. 혼불 마을에 가기 위해서다.
남원에 있는 혼불 마을로 가는 길, 사발 가득 흰쌀밥이 담긴 듯 사발꽃이 복스럽게 피었다. 자잘한 이팝나무도 꽃을 피워냈다. 막 모내기를 한 논에는 찰방찰방 물이 차 있다. 길섶의 민들레도 샛노란 빛을 뽐낸다.
눈물 나게 좋은 봄이다.
‘꽃심을 지닌 땅’과 ‘아소님하’라는 말을 새긴 장승이 세워져 있는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한겨울 없는 듯 죽은 듯 있던 온갖 꽃들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초록의 순을 올리고 피어난다.
절대 흩어지지 않을 ‘꽃의 힘’ ‘꽃심’이다.
한땀 한땀 수놓듯 싸목싸목 걸어가는 길
창 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기차 여행의 큰 즐거움이다.
남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남짓을 내내 창 밖만 바라보았다. 그래도 충분히 눈이 즐겁다.

온 세상이 녹색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짙은 녹색의 여름 이전, 여리고 설익은 연둣빛의 나무 옷은 바람과 햇살의 도움으로 사금파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11시 조금 못 미처 남원역에 닿았다. 남원역은 예전의 남원역이 아니었다.
만복사지 터가 있는, 순창 가는 길목에 새로 지어져 있다.
관광안내소에서 남원관광안내도 팸플릿을 하나 얻어 버스를 탔다.
시내를 거치는데도 버스는 한산하다. 이따금 약봉지를 든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버스의 승객이다.
시내로 나와 혼불 마을 가는 버스를 갈아 타고 외지고 외진 사매면 노봉마을에 닿았다.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탄 모양이다. 버스에 내리자 친절하게 ‘혼불문학관’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노봉마을 입구에 ‘꽃심을 지닌 땅’ ‘아소님하’라는 글을 새긴 장승들이 반겨준다. 구불구불 오래 된 시멘트 포장길을 걸어 오른다.
의 고향이라서일까? 이 길은 공간을 이동하는 길이 아닌 수백년 수천년 시간을 이동하는 길인 것 같다.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소설 속 종가의 모델이 된 최씨 종가집이 있는 이 곳 일대는 온통 의 무대다. 노적봉이며 벼슬봉이 어깨를 잇대고 어미닭 병아리 품듯 마을과 들녘을 감싸고 있다.
‘치마폭을 펼쳐놓은 것 같은 논을 가르며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동안’ 천천히 오르니 혼불문학관에 닿는다.
소설 (최명희, 1947~1998)은 1930년대 식민지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흔들릴 것도 빼앗길 것도 많았던 그 격동기를 배경으로 작가는 나름의 것들을 ‘지키려는’ 혹은 ‘변화시키려는’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숨결을 담아낸다.
청암부인-율촌댁-효원으로 이어지는 종부(宗婦) 3대, 가문의 삶을 벗어나 만주로 향한 강모·강태 등 당대 젊은 지식인들의 삶, 그리고 민중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다.
이들의 삶을 그리면서 작가는 무엇보다 우리 풍토와 산천초목, 생활습관, 사회제도, 촌락구조, 역사, 세시풍속, 관혼상제를 비롯 주거의 형태와 복장과 음식이며 가구와 그릇 같은 것들에까지 정성을 쏟고 있다. 민담이며 역사며 고사며 고전들도 수시로 넘나든다.
‘혼불문학관’은 ‘노적봉의 나붓이 드러난 발등’ 위로 넓게 터를 잡았다.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기념관, 교육관,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계단을 올라 아늑한 보금자리 한가운데 다다르자 이 지형의 특성을 적어놓은, 의 한 대목을 적어놓은 바위를 맨 먼저 만난다.
‘천추락만세향(千秋樂萬歲享) 노적봉과 벼슬봉의 산자락 기운을 느긋하게 잡아 묶어서, 큰 못을 파고, 그 기맥을 가두어 찰랑찰랑 넘치게 방비책만 잘 간구한다면 가히 백대 천손의 천추락만세향을 누릴 만한 곳이다’
잔디가 가지런히 심어진 마당을 지나 왼편 ‘혼불문학관’에 들어섰다. 작가가 생전 애지중지 했던 몽블랑 만년필과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육필원고, 그리고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잉크병 등이 보인다.
저 두툼한 만년필로 1~2만 장의 원고지를 꾹꾹 눌러썼으리라! 뿐만 아니라 작품일지와 유품, 소설 속의 주요 장면을 인형극과 디오드라마로 재구성해 놓았다.
문학관을 나와 오른편 누각에 오른다. 시원한 대청마루에 서 있으니 노봉마을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다랑이논이 한껏 봄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른편에는 청암부인이 농사짓는 물이 부족하자 실농한 셈치고 2년여에 걸쳐 만든 청호저수지도 보인다.
다시 발길을 돌려 서도역을 찾아간다. 길 건너 찻길이 보이고 오래된 간이역이 보인다. 역 가까이 가도 인적이 없다. 폐쇄된 곳이다. 1940년에 지어진 만큼 외관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서도역은 소설 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강모가 전주로 유학갈 때, 효원이 대실에서 이곳으로 신행을 왔을 때도 이곳을 밟았을 것이다. 역은 만남과 헤어짐의 공간이니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사연들이 고여 있을 게다. 흔적이 서려있을 게다.
소설 속 주요 무대를 한 바퀴 돌며 내내 생각한다. ‘이곳은 그저 ‘문학관’이 아니구나.
한낱 ‘문학마을’이 아니구나.
작가의 혼이 깃든 곳이다. ‘생명의 불꽃’이자 ‘정신의 불꽃’이고 ‘존재의 불꽃’인 ‘혼불’이 떠도는 공간이구나. 조상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취재 : 최명희 기자
사진설명
1. 작가의 혼이 서린 '혼불문학관'
2. 노봉마을 입구 장승. '꽃심'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게다
3. 만남과 헤어짐이 빈번한, 그래서 세월이 고였을 '서도역'
11시 조금 못 미처 남원역에 닿았다. 남원역은 예전의 남원역이 아니었다.
만복사지 터가 있는, 순창 가는 길목에 새로 지어져 있다.
관광안내소에서 남원관광안내도 팸플릿을 하나 얻어 버스를 탔다.
시내를 거치는데도 버스는 한산하다. 이따금 약봉지를 든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버스의 승객이다.
시내로 나와 혼불 마을 가는 버스를 갈아 타고 외지고 외진 사매면 노봉마을에 닿았다.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탄 모양이다. 버스에 내리자 친절하게 ‘혼불문학관’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노봉마을 입구에 ‘꽃심을 지닌 땅’ ‘아소님하’라는 글을 새긴 장승들이 반겨준다. 구불구불 오래 된 시멘트 포장길을 걸어 오른다.
의 고향이라서일까? 이 길은 공간을 이동하는 길이 아닌 수백년 수천년 시간을 이동하는 길인 것 같다.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소설 속 종가의 모델이 된 최씨 종가집이 있는 이 곳 일대는 온통 의 무대다. 노적봉이며 벼슬봉이 어깨를 잇대고 어미닭 병아리 품듯 마을과 들녘을 감싸고 있다.
‘치마폭을 펼쳐놓은 것 같은 논을 가르며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동안’ 천천히 오르니 혼불문학관에 닿는다.
소설 (최명희, 1947~1998)은 1930년대 식민지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흔들릴 것도 빼앗길 것도 많았던 그 격동기를 배경으로 작가는 나름의 것들을 ‘지키려는’ 혹은 ‘변화시키려는’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숨결을 담아낸다.
청암부인-율촌댁-효원으로 이어지는 종부(宗婦) 3대, 가문의 삶을 벗어나 만주로 향한 강모·강태 등 당대 젊은 지식인들의 삶, 그리고 민중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다.
이들의 삶을 그리면서 작가는 무엇보다 우리 풍토와 산천초목, 생활습관, 사회제도, 촌락구조, 역사, 세시풍속, 관혼상제를 비롯 주거의 형태와 복장과 음식이며 가구와 그릇 같은 것들에까지 정성을 쏟고 있다. 민담이며 역사며 고사며 고전들도 수시로 넘나든다.
‘혼불문학관’은 ‘노적봉의 나붓이 드러난 발등’ 위로 넓게 터를 잡았다.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기념관, 교육관, 누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계단을 올라 아늑한 보금자리 한가운데 다다르자 이 지형의 특성을 적어놓은, 의 한 대목을 적어놓은 바위를 맨 먼저 만난다.
‘천추락만세향(千秋樂萬歲享) 노적봉과 벼슬봉의 산자락 기운을 느긋하게 잡아 묶어서, 큰 못을 파고, 그 기맥을 가두어 찰랑찰랑 넘치게 방비책만 잘 간구한다면 가히 백대 천손의 천추락만세향을 누릴 만한 곳이다’
잔디가 가지런히 심어진 마당을 지나 왼편 ‘혼불문학관’에 들어섰다. 작가가 생전 애지중지 했던 몽블랑 만년필과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육필원고, 그리고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잉크병 등이 보인다.
저 두툼한 만년필로 1~2만 장의 원고지를 꾹꾹 눌러썼으리라! 뿐만 아니라 작품일지와 유품, 소설 속의 주요 장면을 인형극과 디오드라마로 재구성해 놓았다.
문학관을 나와 오른편 누각에 오른다. 시원한 대청마루에 서 있으니 노봉마을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다랑이논이 한껏 봄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른편에는 청암부인이 농사짓는 물이 부족하자 실농한 셈치고 2년여에 걸쳐 만든 청호저수지도 보인다.
다시 발길을 돌려 서도역을 찾아간다. 길 건너 찻길이 보이고 오래된 간이역이 보인다. 역 가까이 가도 인적이 없다. 폐쇄된 곳이다. 1940년에 지어진 만큼 외관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서도역은 소설 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강모가 전주로 유학갈 때, 효원이 대실에서 이곳으로 신행을 왔을 때도 이곳을 밟았을 것이다. 역은 만남과 헤어짐의 공간이니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사연들이 고여 있을 게다. 흔적이 서려있을 게다.
소설 속 주요 무대를 한 바퀴 돌며 내내 생각한다. ‘이곳은 그저 ‘문학관’이 아니구나.
한낱 ‘문학마을’이 아니구나.
작가의 혼이 깃든 곳이다. ‘생명의 불꽃’이자 ‘정신의 불꽃’이고 ‘존재의 불꽃’인 ‘혼불’이 떠도는 공간이구나. 조상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취재 : 최명희 기자
사진설명
1. 작가의 혼이 서린 '혼불문학관'
2. 노봉마을 입구 장승. '꽃심'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게다
3. 만남과 헤어짐이 빈번한, 그래서 세월이 고였을 '서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