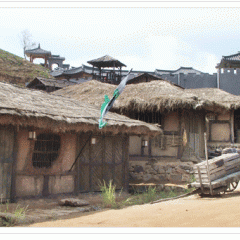숨은 듯 감춘 듯 산 속 마애불의 미소, 노적봉 ‘마애불’
숨은 듯 감춘 듯 산 속 마애불의 미소, 노적봉 ‘마애불’
by 운영자 2006.05.26

소설 에는 호성암(虎成庵)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
호성암 중들 떡 나누대끼’, 종이꽃을 잘 만든다는 호성암 주지 도환, 호성암의 창건설화까지 세세하게 나온다. 호성암이 정말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물어물어 길을 나선다.
한 노승이 길을 가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울고 있는 호랑이의 입에서 가시를 빼 주었더니, 그 호랑이가 다시 은혜를 갚아서 절이 생기게 된 절이라 하여 ‘호성암(虎成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혼불문학관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마을의 끝이다. 길을 산 속으로 쭉 뻗어있다.
마을 할머니가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이 떠오른다.
“혼자서 거그를 갈라고? 못 가. 워메, 우덜도 거그는 잘 안 가. 글고 거그 절 없어. 6·25 동란 땐가 없어졌다드만. 나도 못 봤어. 갔다가 길 못 찾으믄 어찔라고 그래? 오메, 가지 말어. 가지 말어.”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한 길이다. 길 잃기 딱 좋은 길. 정신을 똑바로 하고 산길을 오른다. 빵 조각이라도 있었다면 그 빵 조각으로라도 길을 표시해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못 내려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마을 할머니가 올라가는 걸 보셨으니 괜찮겠지 하는 위안과 호성암이 없어도 꼭 가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교차한다.
한참을 오르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오른쪽 길은 계곡 쪽으로 뻗어있고, 왼쪽 길은 산모롱이를 감싸듯 뻗어있었다.
호성암 가는 길은 오른쪽 길도 왼쪽 길도 아니다. 길 없는 두 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희미하게 길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도 안 다닌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 길은 흙먼지와 나뭇잎이 가득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계곡에 버티고 있는 바위들이 보인다.
바위에 물길이 나있다. 비 온 다음이라서인지 바위를 따라 꽤 많은 물이 흐른다.
여름이면 물이 불어나 폭포를 이루는 장관도 볼 수 있단다.
이곳이 호성암 터이다. 할머니 말씀처럼 6·25 전까지는 호성암이라는 절이 있던 자리다.
시누대 대밭을 지나가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거기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마애불이 있다. 마애불은 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조각 작품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다는 마애불은 은은한 미소가 참 자연스럽다. 손에 활짝 핀 연꽃도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연좌(불교에서, 심신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좌선을 하는 일) 아래의 구름 문양 선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다.
비록 소설 속 호성암은 못 봤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오늘 더 큰 것을 얻었다. ‘괜찮다, 괜찮다’ 웃고 있는 마애불의 미소를 만났으니 말이다.
취재 : 최명희 기자
사진설명
호성암 마애불. 소설 속 호성암은 사라지고 없지만 대신 숨은 듯 있는 마애불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호성암 중들 떡 나누대끼’, 종이꽃을 잘 만든다는 호성암 주지 도환, 호성암의 창건설화까지 세세하게 나온다. 호성암이 정말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물어물어 길을 나선다.
한 노승이 길을 가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울고 있는 호랑이의 입에서 가시를 빼 주었더니, 그 호랑이가 다시 은혜를 갚아서 절이 생기게 된 절이라 하여 ‘호성암(虎成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혼불문학관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마을의 끝이다. 길을 산 속으로 쭉 뻗어있다.
마을 할머니가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이 떠오른다.
“혼자서 거그를 갈라고? 못 가. 워메, 우덜도 거그는 잘 안 가. 글고 거그 절 없어. 6·25 동란 땐가 없어졌다드만. 나도 못 봤어. 갔다가 길 못 찾으믄 어찔라고 그래? 오메, 가지 말어. 가지 말어.”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한 길이다. 길 잃기 딱 좋은 길. 정신을 똑바로 하고 산길을 오른다. 빵 조각이라도 있었다면 그 빵 조각으로라도 길을 표시해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못 내려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마을 할머니가 올라가는 걸 보셨으니 괜찮겠지 하는 위안과 호성암이 없어도 꼭 가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교차한다.
한참을 오르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오른쪽 길은 계곡 쪽으로 뻗어있고, 왼쪽 길은 산모롱이를 감싸듯 뻗어있었다.
호성암 가는 길은 오른쪽 길도 왼쪽 길도 아니다. 길 없는 두 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희미하게 길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도 안 다닌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 길은 흙먼지와 나뭇잎이 가득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계곡에 버티고 있는 바위들이 보인다.
바위에 물길이 나있다. 비 온 다음이라서인지 바위를 따라 꽤 많은 물이 흐른다.
여름이면 물이 불어나 폭포를 이루는 장관도 볼 수 있단다.
이곳이 호성암 터이다. 할머니 말씀처럼 6·25 전까지는 호성암이라는 절이 있던 자리다.
시누대 대밭을 지나가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거기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마애불이 있다. 마애불은 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조각 작품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다는 마애불은 은은한 미소가 참 자연스럽다. 손에 활짝 핀 연꽃도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연좌(불교에서, 심신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좌선을 하는 일) 아래의 구름 문양 선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다.
비록 소설 속 호성암은 못 봤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오늘 더 큰 것을 얻었다. ‘괜찮다, 괜찮다’ 웃고 있는 마애불의 미소를 만났으니 말이다.
취재 : 최명희 기자
사진설명
호성암 마애불. 소설 속 호성암은 사라지고 없지만 대신 숨은 듯 있는 마애불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