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버석거리는 날에는 ‘자갈치시장’에 가야 한다
마음이 버석거리는 날에는 ‘자갈치시장’에 가야 한다
by 운영자 2006.12.01

한해를 매듭짓는 ‘매듭달’ 12월이다.
12월에는 후회와 기대가 교차한다. ‘올해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을까’,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기대가 한 마음 안에 웅숭그리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지난 발자욱에 스민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12월의 시작이 무겁다.
‘사는 것이 무의미해 질 때 시장에 가 보라.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살이에 대하여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행을 하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세상살이가 힘겹다. 시장으로 여행을 떠나자.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으로 가야 하고, 마음이 버석거리는 날에는 ‘자갈치 시장’으로 가야 한다.
12월에는 후회와 기대가 교차한다. ‘올해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을까’,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기대가 한 마음 안에 웅숭그리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지난 발자욱에 스민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12월의 시작이 무겁다.
‘사는 것이 무의미해 질 때 시장에 가 보라.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살이에 대하여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행을 하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세상살이가 힘겹다. 시장으로 여행을 떠나자.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으로 가야 하고, 마음이 버석거리는 날에는 ‘자갈치 시장’으로 가야 한다.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부산 남포동 골목 대탐험
“결혼은 언제 할라고? 사람은 있냐?”
칠순이 다 돼가는 큰당숙모의 질문. “아니오. 아직 없어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늘 민망해지는 나의 대답.
“걍 웬만한 놈으로 골라야. 다 거그서 거기여. 니 눈에 꽉 차는 빼쪽한 사람이 어디 있다냐. 남자 다 거그서 거그드라. 사는 것도 그래야. 다 거그서 거그여야.” 큰당숙모의 현답이다.
‘남자도 다 거기서 거기. 사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종종 남과 나를 비교해가며 좌절하고 며칠씩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2006년 끄트머리, ‘다 거기서 거기’임을 증명하러, 인정받으러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 복작대는 부산 남포동으로 떠난다.

남포동 입구에는 부산영화제의 주무대로 사용되는 피프(PIFF) 광장이 있다. 장이모, 기타노 다케시 등 영화인의 손도장이 찍힌 핸드프린팅 거리가 있고 국도극장,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CGV남포 등이 국제영화제 거리답게 촘촘하게 들어서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난 볼거리도 기다린다.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골목 재미가 묻어난다.

피프 광장 가는 길의 국제시장 들어가는 초입에는 먹자 골목이 조성돼 있다.
목욕탕용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잡채, 충무김밥, 부산오뎅 등을 먹는 것은 색다른 경험.
피프 광장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부산어묵과 호떡 노점상이 줄지어 있고, 영화 관람의 필수 지참품 오징어와 땅콩을 파는 좌판대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 행여 광장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실망은 말자. 영화제 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스타들이 걸었던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멋진 경험이 될 테니!
목욕탕용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잡채, 충무김밥, 부산오뎅 등을 먹는 것은 색다른 경험.
피프 광장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부산어묵과 호떡 노점상이 줄지어 있고, 영화 관람의 필수 지참품 오징어와 땅콩을 파는 좌판대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 행여 광장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실망은 말자. 영화제 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스타들이 걸었던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멋진 경험이 될 테니!

영화의 거리가 끝나는 곳에서 우회전해 미술의 거리를 지나면 왼쪽으로 간판도 없는 ‘깡통시장’이 나타난다. ‘깡통’이란 이름은 한국전쟁 후 이곳에서 미군 물품(통조림 등)이 거래됐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좁은 골목 한가득 일본을 오가는 보따리장사꾼이 풀어놓는 수입품과 짝퉁 명품, 갖가지 식품과 건어물 등이 뒤섞여 있다.
좁은 골목 한가득 일본을 오가는 보따리장사꾼이 풀어놓는 수입품과 짝퉁 명품, 갖가지 식품과 건어물 등이 뒤섞여 있다.

국제시장 건너편에는 말로만 듣던 자갈치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고 크게 쓰인 간판이 웃음을 자아낸다. 복닥거린다. 정말 복닥거린다. “싸게 주께 사가꼬 가지예” “언니야! 이거 묵고 가” 호객 행위도 즐거운 것이 되고 만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어시장으로 부산사람들의 애환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곳. 영도대교 및 건어물 시장에서부터 남부민동 새벽시장까지를 자갈치시장이라 하는데 수협 자갈치공판장을 중심으로 각종 건어물, 횟집, 포장마차, 노점 등이 빼곡히 들어서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어시장으로 부산사람들의 애환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곳. 영도대교 및 건어물 시장에서부터 남부민동 새벽시장까지를 자갈치시장이라 하는데 수협 자갈치공판장을 중심으로 각종 건어물, 횟집, 포장마차, 노점 등이 빼곡히 들어서있다.

매일 싱싱한 도미, 넙치, 방어, 전복, 멍게, 오징어, 낙지 등 300여 종의 어패류가 새벽을 타고 이곳에 부려지면 경상도 아지매의 투박한 사투리와 경매인의 호각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자갈치 시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처음 자갈치시장은 1924년 남빈시장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어 8.15광복 이후 이곳이 수산물 집산지가 되고 노점상들의 활어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이 되었다. 당시 6.25전쟁 이후 여인네들을 중심으로 어시장이 자리를 굳히게 되어 지금의 ‘자갈치 아지매’라는 정겨운 이름도 생겨났다고 한다.
처음 자갈치시장은 1924년 남빈시장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어 8.15광복 이후 이곳이 수산물 집산지가 되고 노점상들의 활어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이 되었다. 당시 6.25전쟁 이후 여인네들을 중심으로 어시장이 자리를 굳히게 되어 지금의 ‘자갈치 아지매’라는 정겨운 이름도 생겨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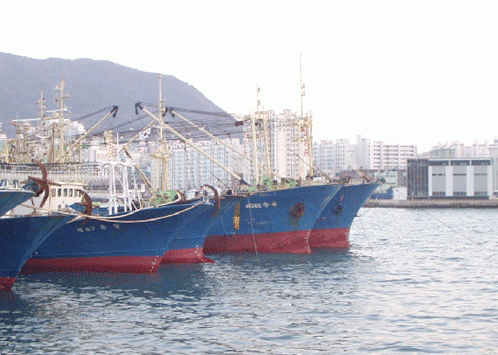
한바퀴 죽 둘러보고 나니 가라앉았던 마음이 어느새 붕~. ‘그래. 사는 것이 뭐 별 거더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풀고, 울고 웃고, 복닥거리며 사는 거지.’ 남포동을 걸어나오는 길, 거창하게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얻는다. 다시 내일을 향해 한발 내딛을 용기를 얻는다.
[최명희 기자 - yurial78@naver.com]
[최명희 기자 - yurial7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