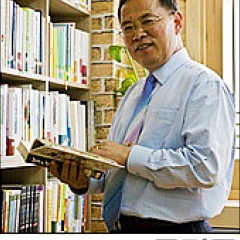[장인우의 고전읽기] 아, 고운 님 여의옵고 (2) - 이생 규장전을 읽으며 듣노라'
[장인우의 고전읽기] 아, 고운 님 여의옵고 (2) - 이생 규장전을 읽으며 듣노라'
by 운영자 2016.02.26
울지 마라 /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 정호승 ‘수선화에게’-
- 정호승 ‘수선화에게’-

그 사람이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운 것’이라 했네. 그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네. 그 사람, 언제나 나를 대함에 있어 나그네를 대함과 같이 했지. 나를 은혜하고 공경함에 있어 양홍(梁鴻)의 처 맹광(孟光)과 같았지.여보게 벗이여, 거안제미(擧案齊眉)를 아시는가? 밥상을 들어 그 높이를 눈썹에 맞추어 남편을 깍듯이 존경하여 화목하게 산다는 고사를 비유한 것일세.
옛날 후한 때 양홍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네.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난세를 만나 아버지를 돗자리에 말아 매장한 후, 태학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가난하지만 절조를 숭상했고, 널리 책을 읽어 두루두루 학식을 쌓았다네.
이윽고 공부를 마친 양홍은 상림원이라는 곳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만 불이 나서 다른 집들까지 태우고 말았다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러자 양홍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돼지로 손실을 갚았고, 나머지 돼지로 보상이 되지 않는 집들은 아침저녁 노동으로 갚았다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명문가들마다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야단이었다지.
그런데 양홍의 아내가 된 규수는 뜻밖에도 피부는 검고, 뚱뚱한 데다 힘은 장사여서 돌로 된 큰 절구를 들어 올릴 정도인데,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 ‘양홍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양홍이 그 규수와 혼인을 했다네. 화장을 하고 비단옷을 입고 시집을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양홍이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자신이 원하는 여자는 누더기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서라도 살 수 있는 여자’ 라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머리를 옛날처럼 하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그때서야 양홍이 기뻐하며 그 여인에게 덕요(德曜)라는 자와 맹광(孟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산골에서 살았다는구만.
이후 맹광은 양홍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 양홍 앞에서 감히 올려다 보지 아니하고 밥상을 눈썹 위까지 들어 올려 바쳤다네. 가히 본받을 만하지 하지 않은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의 삶 역시 그러했건만, 나는 양홍을 결코 따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가슴에 새기고 출사했고, 높은 벼슬에도 올랐지만 백성은 고사하고 그 사람과 가족들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네.
신축년(1361, 공민왕10년)에 홍건적이 두 번째로 쳐들어 왔다네. 삽시간에 서울이 오랑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상감께서는 복주(지금의 안동)로 파천하신 뒤 나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갔으나, 오랑캐에게 그 사람을 잃고 말았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는데,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채 홀로 살아 숨 쉬는 내 자신이 이리도 부끄러울 줄은 진정 몰랐다네.
영남 농막 시절의 이별의 아픔을 다 씻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오랑캐에게 잃고 말았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슬프고 아린 순간들…. 구슬픈 한바탕 꿈이었다네.
그 사람이 다시 내게로 왔네. 내게 따스한 눈빛으로 사람 된 자의 도리를 일깨워 주었고, 부부의 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지.
내 그 사람을 어찌 단 한 순간이라도 떼어두고 보겠나. 꿈같은 시간들…. 삼생(과거·현재·미래)의 인연, 그 시간이 다 끝났으니 가야 한다는 그 말.
아, 보고 싶네. 그 사람이 보고 싶네. 이별 뒤에 남겨진 그리움을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오늘처럼 빗물 스며드는 밤이면 너울거리는 촛불 사이로 그 사람이 다시 올 것만 같아 마음은 싸리울 너머를 서성인다네.
벗이여, 고맙네. 홀로 서글픈 나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추억하게 해 주었으니 말이네.
자네는 수선화를 본 적 있는가?
옛날 후한 때 양홍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네.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난세를 만나 아버지를 돗자리에 말아 매장한 후, 태학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가난하지만 절조를 숭상했고, 널리 책을 읽어 두루두루 학식을 쌓았다네.
이윽고 공부를 마친 양홍은 상림원이라는 곳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만 불이 나서 다른 집들까지 태우고 말았다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러자 양홍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돼지로 손실을 갚았고, 나머지 돼지로 보상이 되지 않는 집들은 아침저녁 노동으로 갚았다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명문가들마다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야단이었다지.
그런데 양홍의 아내가 된 규수는 뜻밖에도 피부는 검고, 뚱뚱한 데다 힘은 장사여서 돌로 된 큰 절구를 들어 올릴 정도인데,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 ‘양홍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양홍이 그 규수와 혼인을 했다네. 화장을 하고 비단옷을 입고 시집을 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양홍이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자신이 원하는 여자는 누더기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서라도 살 수 있는 여자’ 라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머리를 옛날처럼 하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그때서야 양홍이 기뻐하며 그 여인에게 덕요(德曜)라는 자와 맹광(孟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산골에서 살았다는구만.
이후 맹광은 양홍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 양홍 앞에서 감히 올려다 보지 아니하고 밥상을 눈썹 위까지 들어 올려 바쳤다네. 가히 본받을 만하지 하지 않은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의 삶 역시 그러했건만, 나는 양홍을 결코 따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가슴에 새기고 출사했고, 높은 벼슬에도 올랐지만 백성은 고사하고 그 사람과 가족들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네.
신축년(1361, 공민왕10년)에 홍건적이 두 번째로 쳐들어 왔다네. 삽시간에 서울이 오랑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상감께서는 복주(지금의 안동)로 파천하신 뒤 나도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갔으나, 오랑캐에게 그 사람을 잃고 말았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는데,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채 홀로 살아 숨 쉬는 내 자신이 이리도 부끄러울 줄은 진정 몰랐다네.
영남 농막 시절의 이별의 아픔을 다 씻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오랑캐에게 잃고 말았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슬프고 아린 순간들…. 구슬픈 한바탕 꿈이었다네.
그 사람이 다시 내게로 왔네. 내게 따스한 눈빛으로 사람 된 자의 도리를 일깨워 주었고, 부부의 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지.
내 그 사람을 어찌 단 한 순간이라도 떼어두고 보겠나. 꿈같은 시간들…. 삼생(과거·현재·미래)의 인연, 그 시간이 다 끝났으니 가야 한다는 그 말.
아, 보고 싶네. 그 사람이 보고 싶네. 이별 뒤에 남겨진 그리움을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는 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오늘처럼 빗물 스며드는 밤이면 너울거리는 촛불 사이로 그 사람이 다시 올 것만 같아 마음은 싸리울 너머를 서성인다네.
벗이여, 고맙네. 홀로 서글픈 나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추억하게 해 주었으니 말이네.
자네는 수선화를 본 적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