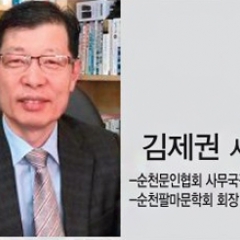아, 어머니
아, 어머니
by 이규섭 시인 2019.01.25

어머니에게 가야 할 나이가 가까워지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리움의 원천이다. 간밤에는 어머니 기일이라 그리움이 더 애틋하다.제사상에 올린 한겨울 싱싱한 딸기를 보며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진다.
어머니는 겨울딸기는커녕 제철 딸기 구경조차 못했다. 색다른 과일을 보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이유다.
먹거리가 흔치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과일은 밭머리에 아버지가 두어 그루 심어놓은 복숭아가 고작이다. 까칠 복숭아 보다 크고 달았다.
감은 큰댁에 가야 먹을 수 있었고, 앵두는 한 마을 고모네 집 담장에 봄이면 붉은 입술을 드러냈다.
포도 대신 머루, 키위 대신 다래가 과일 대용이다. 제사상의 딸기는 결국 살아있는 자손들의 몫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며 흐뭇해하실 거다.
예전의 겨울은 윗목 자리끼가 얼 정도로 추웠다. 초저녁에 넣은 군불은 새벽이면 싸늘하게 식는다.
마당에서 세수를 한 뒤 방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무명옷에 쉐터를 걸치고 솜버선에 고무신으로 살 에이는 혹독한 겨울을 났다.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다.
몇 해 전 여름휴가 때, 팔순의 첫째 누님은 고운 비단옷 한 벌을 사와 고향에 묻힌 어머니 산소 앞에서 태우며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다.
가난한 살림 꾸려 가느라 친정어머니에게 변변한 옷 한 벌 해드리지 못한 회한과 설움을 그렇게 풀어냈다.
무명 옷 대신 설운 잔디 옷 걸친 어머니께 따뜻한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다. 외로움의 골은 깊었고 그리움은 사무쳤다.
딸 넷 낳은 뒤 얻은 아들이라 애지중지 살뜰하게 보살피던 어머니가 눈에 선하다.
어머니가 밤 마실 갈 때면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다녔다. 초등학교 저학년 운동회 때 키 작은 아들이 1등으로 들어오자 함박꽃같이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장가가던 날 누님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눈물 바람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삶의 희비가 교차할 때마다 떠오른다.
어머니는 50대 초반, 내가 고교 입시 준비를 하던 섣달,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다. 그날 희끗희끗 흩날리던 눈발은 어머니의 하얀 영혼처럼 잿빛 하늘을 낮게 떠돌았다.
그때 중3이던 아들이 칠십대 늙은이가 됐다.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반듯하게 자라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은 했다고 자부한다.
어머니가 지켜보셨다면 얼마나 대견해하셨을까. 효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돌아가셨지만 병명조차 몰랐다. 속병으로 통칭되는 위장병인지, 위암인지 모르는 게 통한이다.
의료혜택이 빈약한 시절 진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 요즘은 체하거나 콧물만 나도 병원을 찾는 데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깝다.
자신을 찌르고 달아나는 아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옷 갈아입고 가라”는 것이 이 땅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겨울딸기는커녕 제철 딸기 구경조차 못했다. 색다른 과일을 보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이유다.
먹거리가 흔치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과일은 밭머리에 아버지가 두어 그루 심어놓은 복숭아가 고작이다. 까칠 복숭아 보다 크고 달았다.
감은 큰댁에 가야 먹을 수 있었고, 앵두는 한 마을 고모네 집 담장에 봄이면 붉은 입술을 드러냈다.
포도 대신 머루, 키위 대신 다래가 과일 대용이다. 제사상의 딸기는 결국 살아있는 자손들의 몫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며 흐뭇해하실 거다.
예전의 겨울은 윗목 자리끼가 얼 정도로 추웠다. 초저녁에 넣은 군불은 새벽이면 싸늘하게 식는다.
마당에서 세수를 한 뒤 방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무명옷에 쉐터를 걸치고 솜버선에 고무신으로 살 에이는 혹독한 겨울을 났다.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다.
몇 해 전 여름휴가 때, 팔순의 첫째 누님은 고운 비단옷 한 벌을 사와 고향에 묻힌 어머니 산소 앞에서 태우며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다.
가난한 살림 꾸려 가느라 친정어머니에게 변변한 옷 한 벌 해드리지 못한 회한과 설움을 그렇게 풀어냈다.
무명 옷 대신 설운 잔디 옷 걸친 어머니께 따뜻한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다. 외로움의 골은 깊었고 그리움은 사무쳤다.
딸 넷 낳은 뒤 얻은 아들이라 애지중지 살뜰하게 보살피던 어머니가 눈에 선하다.
어머니가 밤 마실 갈 때면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다녔다. 초등학교 저학년 운동회 때 키 작은 아들이 1등으로 들어오자 함박꽃같이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장가가던 날 누님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눈물 바람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삶의 희비가 교차할 때마다 떠오른다.
어머니는 50대 초반, 내가 고교 입시 준비를 하던 섣달,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다. 그날 희끗희끗 흩날리던 눈발은 어머니의 하얀 영혼처럼 잿빛 하늘을 낮게 떠돌았다.
그때 중3이던 아들이 칠십대 늙은이가 됐다.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반듯하게 자라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은 했다고 자부한다.
어머니가 지켜보셨다면 얼마나 대견해하셨을까. 효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돌아가셨지만 병명조차 몰랐다. 속병으로 통칭되는 위장병인지, 위암인지 모르는 게 통한이다.
의료혜택이 빈약한 시절 진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는다. 요즘은 체하거나 콧물만 나도 병원을 찾는 데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깝다.
자신을 찌르고 달아나는 아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옷 갈아입고 가라”는 것이 이 땅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