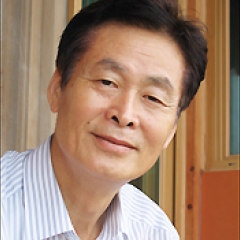땀과 노력, 고독한 시간에 대한 댓가
땀과 노력, 고독한 시간에 대한 댓가
by 운영자 2012.08.07
나는 운동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데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내가 요즘 올림픽 경기를 즐겨본다. 경기에 대한 규칙을 알아서 본다기보다는 순전히 애국심의 발로인 것 같다.
누가 메달을 따고, 어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TV를 시청한다. 어제 저녁은 한국 남녀 유도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했다.
단 5분간의 경기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4년간의 피땀을 흘렸을 것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짠하다. 어느 경기를 보아도 선수들이 몇 년 공들인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다. 그들이 몇 년간 훈련을 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할 목표를 향한 집념,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들이 감내해야할 고독이 내게도 스며든다.
선수들을 보면서 진리를 구하고자 인도(India)로 향했던 신라의 혜초, 중국의 현장법사, 법현 등 구법승들을 떠올렸다. 중국은 인도 불교와는 다른 독특한 북방의 대승불교를 탄생시켰다.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는 목숨을 건 구법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99년 인도로 떠났던 중국 최초의 구법승은 법현 스님이라고 하지만 이 승려가 최초가 아니다.
법현 이전, 수많은 승려들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인도로 향해 가는 도중 죽음을 맞이했고, 인도에서 입적한 승려도 있다. <법현전>에는 당시 승려들이 구법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막에는 많은 악귀와 매섭고 더운 바람이 있으며, 이들을 만나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 하늘에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위에는 달리는 짐승 한 마리 없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두루 살피며 길을 찾아보아도 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죽은 사람의 뼈만이 길잡이가 될 뿐이다.
구법승들이 인도를 향해 걸었던 이정표가 죽은 사람의 뼈와 해골이었다는 사실을 믿겠는가. 현장법사도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길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탈진상태가 되기도 하였고, 수차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인도에 도착하지 못하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맹세를 하였다. 이런 구법승들이 있었기에 중국과 한국의 불교학은 2000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다.
몇 년전 나는 구법승들의 길을 따라 중국 북쪽(돈황 부근)에 위치한 실크로드를 탐방한 적이 있었다. 허허로운 긴 들판에 어울대는 빈 허공, 그곳 끝자락 고독의 바다에서 한참이나 허우적댔던 날들이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사막, 황량한 들판인 황무지, 돌산으로 가득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가며 인간이 이겨내야 하는 고독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가슴에 새겼다. 바로 그 길이 죽음과 맞서 싸웠던 구법승들이 거쳐 갔던 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 떠났던 고독한 구법승들. 그 몇 분간의 경기를 위해 고독과 싸우며 몇 년간을 훈련했던 운동선수들.
고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향해 홀로 묵묵히 걷는 이들의 진지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단순히 메달을 땄느냐 따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어찌 운동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메달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들이 수년 동안 흘렸을 땀과 노력, 감내했던 인내의 깊이, 집념과 고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것이다.
정운 <스님>
누가 메달을 따고, 어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TV를 시청한다. 어제 저녁은 한국 남녀 유도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했다.
단 5분간의 경기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4년간의 피땀을 흘렸을 것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짠하다. 어느 경기를 보아도 선수들이 몇 년 공들인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다. 그들이 몇 년간 훈련을 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할 목표를 향한 집념,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들이 감내해야할 고독이 내게도 스며든다.
선수들을 보면서 진리를 구하고자 인도(India)로 향했던 신라의 혜초, 중국의 현장법사, 법현 등 구법승들을 떠올렸다. 중국은 인도 불교와는 다른 독특한 북방의 대승불교를 탄생시켰다.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는 목숨을 건 구법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99년 인도로 떠났던 중국 최초의 구법승은 법현 스님이라고 하지만 이 승려가 최초가 아니다.
법현 이전, 수많은 승려들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인도로 향해 가는 도중 죽음을 맞이했고, 인도에서 입적한 승려도 있다. <법현전>에는 당시 승려들이 구법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막에는 많은 악귀와 매섭고 더운 바람이 있으며, 이들을 만나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 하늘에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위에는 달리는 짐승 한 마리 없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두루 살피며 길을 찾아보아도 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죽은 사람의 뼈만이 길잡이가 될 뿐이다.
구법승들이 인도를 향해 걸었던 이정표가 죽은 사람의 뼈와 해골이었다는 사실을 믿겠는가. 현장법사도 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길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탈진상태가 되기도 하였고, 수차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인도에 도착하지 못하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맹세를 하였다. 이런 구법승들이 있었기에 중국과 한국의 불교학은 2000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다.
몇 년전 나는 구법승들의 길을 따라 중국 북쪽(돈황 부근)에 위치한 실크로드를 탐방한 적이 있었다. 허허로운 긴 들판에 어울대는 빈 허공, 그곳 끝자락 고독의 바다에서 한참이나 허우적댔던 날들이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사막, 황량한 들판인 황무지, 돌산으로 가득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가며 인간이 이겨내야 하는 고독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가슴에 새겼다. 바로 그 길이 죽음과 맞서 싸웠던 구법승들이 거쳐 갔던 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 떠났던 고독한 구법승들. 그 몇 분간의 경기를 위해 고독과 싸우며 몇 년간을 훈련했던 운동선수들.
고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향해 홀로 묵묵히 걷는 이들의 진지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단순히 메달을 땄느냐 따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어찌 운동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메달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들이 수년 동안 흘렸을 땀과 노력, 감내했던 인내의 깊이, 집념과 고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것이다.
정운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