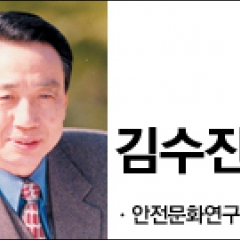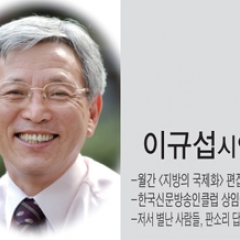몽촌의 봄기별
몽촌의 봄기별
by 운영자 2015.02.02

몽촌의 봄기별이 꽃 피듯 건너오는/ 붉어진 배롱나무 기대어선 선사시대/ 투명한 살결만 같은 그 내력을 읽는다// 아리수 물굽이로 경계들은 무너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을 흘러가는 사람들이/ 해 돋는 강동마을로 덩굴손을 뻗는다// 햇살 따라 얼키설키 엮어가는 역사의 장/ 그 속에 피던 사랑 배롱꽃에 어리는지/ 이 아침 한강변 어귀 옛사람의 숨결 깊다-졸시, 「움집의 내력」전문
아직은 한겨울인가? 며칠 따뜻하여 겨울비까지 내리더니, 오늘은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삼한사온의 기후라서 3일 춥고 4일 따스한 겨울 날씨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며칠 후면 2월 4일, 입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돌아올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이 더욱 춥고 살기 힘든 계절이라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가난한 사람뿐이겠는가.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서울에서도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강동구, 해 돋는 마을, 봄도 가장 빨리 오지 않을까? 여기엔 선사시대의 움집과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을 기려 해마다 10월이면 암사동 문화유적지에선 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선사문화축제는 6,000년 문화유산인 서울 암사동 유적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또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득한 6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움집을 짓고, 그 속에서 불을 피우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 움집과 그때의 조상들이 살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을 구경하노라면 내 속에도 6천 년 전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 내력이 투명하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아리수(한강)의 물을 먹으며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며, 그 물을 벗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근원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암사동 마을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을 것이다. 암사동 마을을 향해 덩굴손을 뻗는 현대인들, 그들은 과거의 시간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원동력을 얻고 있고, 해가 뜨는 암사동마을은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토기 또한 조상들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만들던 당시 토공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토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빗살무늬를 넣었을까? 지금 보아도 세련된 무늬를 넣을 줄 알았던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토기를 만들었을까 궁금해진다.
‘눈길 덥석 잡아끄는 육천 년 먼 길 너머/ 죽어서도 죽지 않는 집념어린 토공의 혼/ 그 손길 둥근 고요가 서려 있다, 암사동// 움집 틈새마다 퍼져오는 햇살들이/ 사선으로 비스듬히 춤을 추는 이랑마다/ 아리수 고운 파문도 새겨보고 싶었을까// 물결로 바람으로 잎맥으로 생선뼈로/ 신석기 생의 무늬 나긋나긋 굽는 동안/ 못 이룬 사랑도 몇 닢 얹어놓고 싶었을까’ - 졸시, 빗살무늬 토기.
그들의 뒤를 이어 지금 이렇게 아리수 주변의 서울은 번성해 가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맞이하던 봄바람, 올해도 변함없이 따스하게 불어와 언 땅과 언 마음들을 녹이며 푸른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아직은 한겨울인가? 며칠 따뜻하여 겨울비까지 내리더니, 오늘은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삼한사온의 기후라서 3일 춥고 4일 따스한 겨울 날씨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며칠 후면 2월 4일, 입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돌아올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이 더욱 춥고 살기 힘든 계절이라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가난한 사람뿐이겠는가.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서울에서도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강동구, 해 돋는 마을, 봄도 가장 빨리 오지 않을까? 여기엔 선사시대의 움집과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을 기려 해마다 10월이면 암사동 문화유적지에선 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선사문화축제는 6,000년 문화유산인 서울 암사동 유적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또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득한 6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움집을 짓고, 그 속에서 불을 피우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 움집과 그때의 조상들이 살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을 구경하노라면 내 속에도 6천 년 전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 내력이 투명하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아리수(한강)의 물을 먹으며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며, 그 물을 벗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근원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암사동 마을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을 것이다. 암사동 마을을 향해 덩굴손을 뻗는 현대인들, 그들은 과거의 시간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원동력을 얻고 있고, 해가 뜨는 암사동마을은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토기 또한 조상들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만들던 당시 토공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토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빗살무늬를 넣었을까? 지금 보아도 세련된 무늬를 넣을 줄 알았던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토기를 만들었을까 궁금해진다.
‘눈길 덥석 잡아끄는 육천 년 먼 길 너머/ 죽어서도 죽지 않는 집념어린 토공의 혼/ 그 손길 둥근 고요가 서려 있다, 암사동// 움집 틈새마다 퍼져오는 햇살들이/ 사선으로 비스듬히 춤을 추는 이랑마다/ 아리수 고운 파문도 새겨보고 싶었을까// 물결로 바람으로 잎맥으로 생선뼈로/ 신석기 생의 무늬 나긋나긋 굽는 동안/ 못 이룬 사랑도 몇 닢 얹어놓고 싶었을까’ - 졸시, 빗살무늬 토기.
그들의 뒤를 이어 지금 이렇게 아리수 주변의 서울은 번성해 가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맞이하던 봄바람, 올해도 변함없이 따스하게 불어와 언 땅과 언 마음들을 녹이며 푸른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